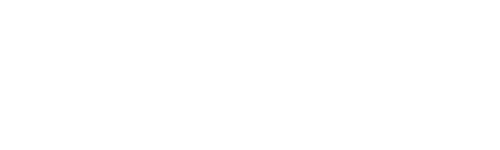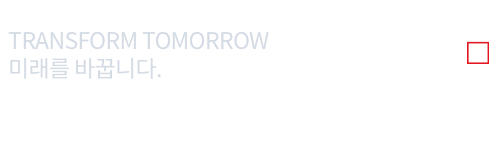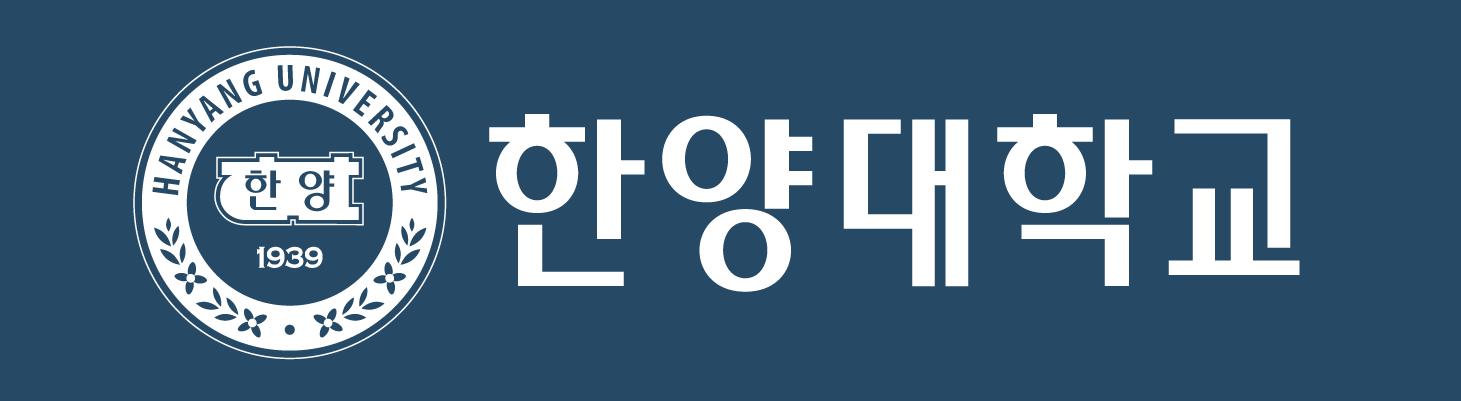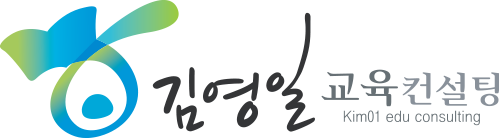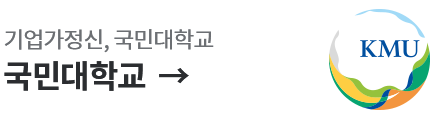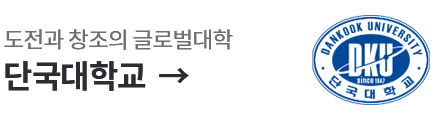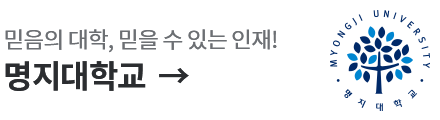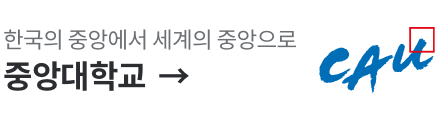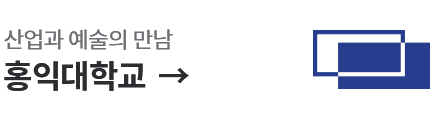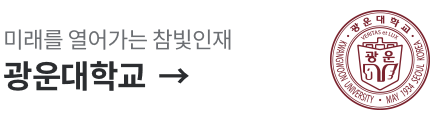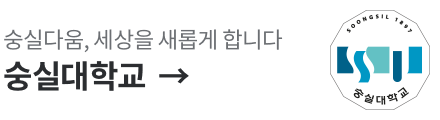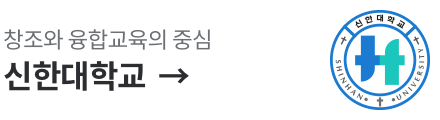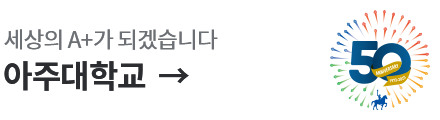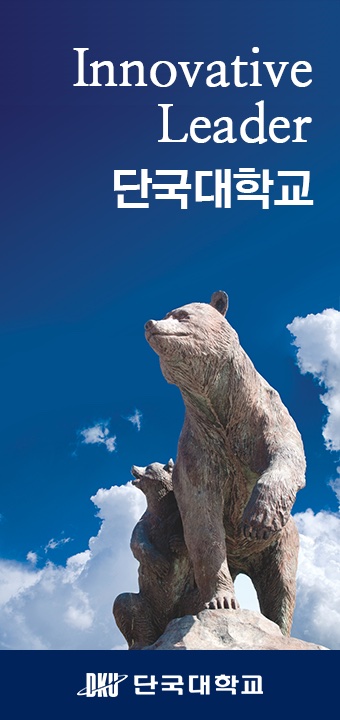- STORY
- 01스토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조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핵심 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새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수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위에서 열거한 6가지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될 것으로 국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서울대학 신입 학생 입학 전형 안내>자료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된 서류를 통해 평가하여 선발하는 서울대학교 인재상은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다음 3가지 요소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학업의지와 태도’, ‘개인적 특성과 소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삼성그룹 홈페이지 인재와 채용란>에서 요구하는 삼성 인재상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인재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대학, 기업에서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재상은 모두 ‘창의적 인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중등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6가지 핵심 역량을 길러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그런 역량을 얼마나 길렀는지를 평가하여 우수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이고, 기업에서는 또 대학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그런 역량을 또 얼마나 길렀는지를 평가하여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도 결국은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인재는 단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는 학생을 포함하여 교육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나 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달성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ufts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스턴버그(Robert J.Sternberg)*에 의하면 창의적인 능력은 새롭고 흥미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며, 창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물들 간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자라고 합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실수할 기회와 그것을 어떻게 교정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단지 해답을 알게 되는 것보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하며,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스턴버그 교수가 교사에게 제안하는 창의성 개발을 위한 12가지 전략 중 ‘자기 효능감 기르기’와 ‘만족 지연하기’ 전략이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직업을 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족 지연’이란 즉각적인 혹은 보상 없이 긴 시간동안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배우면 지연되었던 것이 가장 큰 보상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학생들이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자기 효능감’을 달리 표현하면 ‘자신감’이라 할 수 있고, ‘만족 지연’은 ‘감성 지수(EQ)'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이나 선생님들의 노력 외에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감성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성공지능 가르치기, Robert J. Sternberg 외, 교육과학사
- Related Stories
- 추천 스토리